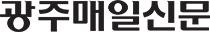흐르는 저 세월을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랴
장희구 박사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(178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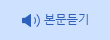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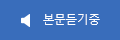
- 재생 준비중
2016. 05. 02(월) 19:16 가+가-
秋日作 (추일작)
송강 정철
산에서 내린 비가 한 줌 댓잎 울려대고
풀벌레 가을 알고 침상 근처 서성일 때
세월을 붙잡지 못해 어찌 하리 백발을.
山雨夜鳴竹 草虫秋近床
산우야명죽 초충추근상
流年那可駐 白髮不禁長
류년나가주 백발불금장
계절이 바뀌면 쓸쓸해진다. 나이 한 살씩 더해지고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진다. 봄은 여자의 계절,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한 해를 재촉하는 가을은 쓸쓸함을 더한다. 그래서 그런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두고 읊조렸던 시(詩)가 유독 많다. 반백이라 하여 인생 쉰 살이 넘어지면 점점 희끗희끗 흰머리가 더해지면서 허무를 느낀다. ‘흐르는 저 세월을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 백발이 자람을 차마 금할 수 없나니’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.
‘흐르는 저 세월을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랴(秋日作)’로 번역해 본 오언절구다.
작가는 송강(松江) 정철(鄭澈: 1536-1593)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. 10세 되던 해인 1545년(인종 1, 명종 즉위)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돼 아버지는 함경도 정평으로, 맏형 자(滋)는 광양으로 유배당했다. 곧이어 아버지만 유배가 풀렸다. 아버지가 유배당할 때 배소에 따라다녔다 한다.
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[조용히 산에 내린 밤비에 온 댓잎이 울어대고 / 풀벌레는 가을이라 침상 가까이 서성이고 있네 // 흐르는 저 세월을 내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 / 백발이 쑥쑥 자람을 차마 금할 수 없다네]라는 시심이다.
위 시제는 ‘어느 가을날에 짓다’로 번역된다. 달력 한 장을 남겨 둔 섣달 보다 소소한 가을이 묻어나는 동짓달이 되면 한 해를 재촉하는 쓸쓸함을 느낀다. 어느 가을날 또 한 해를 재촉하는 서늘하여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한 편의 회포다. 가사의 대가 송강 또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재촉하는 가을 앞에서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한 편의 시를 그냥 두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.
시인은 촉촉하게 내리는 밤비가 한적한 시골집 뒤켠에 서있는 대나무를 그리 섧게 울리고 있다고 시상을 일으키더니 풀벌레는 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침상을 찾아 든다고 했다. 흐르는 저 세월도 머물게 할 수는 없고 오는 백발도 막을 수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음은 역동(易東)의 탄로가(嘆老歌) 시조 한 수를 연상하게 한다.
화자에겐 흔히들 [오는 백발에 가는 청춘]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겠다. 그래서 화자는 흐르는 저 세월을 내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오, 백발이 쑥쑥 자라고 있음을 차마 금할 수 없네 그래. 세월의 무상함을 하염없이 붙잡고 싶어 진다. 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고 오는 백발을 막지 못함을 한탄한다.
※한자와 어구
山雨夜: 산에서 조용히 내리는 밤비. 鳴竹: (밤비를 맞고) 대나무가 울다. 草?풀벌레. 秋: 가을이 되었다. 近床: 참상 가까이서 울다. // 流年: 흐르는 세월. 那: 어찌. 可駐: 가히 머물게 하다. 白髮: 백발. 흰머리. 不禁: 금할 수가 없다. 長: 자라다. ※앞의 ‘那(어찌 나)’가 끝 문장까지 걸리고 있다.
/시조시인·문학평론가 (사)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
송강 정철
산에서 내린 비가 한 줌 댓잎 울려대고
풀벌레 가을 알고 침상 근처 서성일 때
세월을 붙잡지 못해 어찌 하리 백발을.
山雨夜鳴竹 草虫秋近床
산우야명죽 초충추근상
流年那可駐 白髮不禁長
류년나가주 백발불금장
계절이 바뀌면 쓸쓸해진다. 나이 한 살씩 더해지고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진다. 봄은 여자의 계절,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한 해를 재촉하는 가을은 쓸쓸함을 더한다. 그래서 그런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두고 읊조렸던 시(詩)가 유독 많다. 반백이라 하여 인생 쉰 살이 넘어지면 점점 희끗희끗 흰머리가 더해지면서 허무를 느낀다. ‘흐르는 저 세월을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 백발이 자람을 차마 금할 수 없나니’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.
작가는 송강(松江) 정철(鄭澈: 1536-1593)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. 10세 되던 해인 1545년(인종 1, 명종 즉위)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돼 아버지는 함경도 정평으로, 맏형 자(滋)는 광양으로 유배당했다. 곧이어 아버지만 유배가 풀렸다. 아버지가 유배당할 때 배소에 따라다녔다 한다.
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[조용히 산에 내린 밤비에 온 댓잎이 울어대고 / 풀벌레는 가을이라 침상 가까이 서성이고 있네 // 흐르는 저 세월을 내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 / 백발이 쑥쑥 자람을 차마 금할 수 없다네]라는 시심이다.
위 시제는 ‘어느 가을날에 짓다’로 번역된다. 달력 한 장을 남겨 둔 섣달 보다 소소한 가을이 묻어나는 동짓달이 되면 한 해를 재촉하는 쓸쓸함을 느낀다. 어느 가을날 또 한 해를 재촉하는 서늘하여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한 편의 회포다. 가사의 대가 송강 또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재촉하는 가을 앞에서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한 편의 시를 그냥 두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.
시인은 촉촉하게 내리는 밤비가 한적한 시골집 뒤켠에 서있는 대나무를 그리 섧게 울리고 있다고 시상을 일으키더니 풀벌레는 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침상을 찾아 든다고 했다. 흐르는 저 세월도 머물게 할 수는 없고 오는 백발도 막을 수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음은 역동(易東)의 탄로가(嘆老歌) 시조 한 수를 연상하게 한다.
화자에겐 흔히들 [오는 백발에 가는 청춘]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겠다. 그래서 화자는 흐르는 저 세월을 내 어찌 머물게 할 수 있으리오, 백발이 쑥쑥 자라고 있음을 차마 금할 수 없네 그래. 세월의 무상함을 하염없이 붙잡고 싶어 진다. 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고 오는 백발을 막지 못함을 한탄한다.
※한자와 어구
山雨夜: 산에서 조용히 내리는 밤비. 鳴竹: (밤비를 맞고) 대나무가 울다. 草?풀벌레. 秋: 가을이 되었다. 近床: 참상 가까이서 울다. // 流年: 흐르는 세월. 那: 어찌. 可駐: 가히 머물게 하다. 白髮: 백발. 흰머리. 不禁: 금할 수가 없다. 長: 자라다. ※앞의 ‘那(어찌 나)’가 끝 문장까지 걸리고 있다.
/시조시인·문학평론가 (사)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